
늘 주장하는 바이지만 진정한 장애인복지가 실현되려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어, 일대 혁신이라고 하여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장애인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시선들에 큰 변화가 일지 않고서는 일석일조에 사회적인 시선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로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없을 정도로 난마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매듭을 푼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 첫째로,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이어진 동족 간, 전쟁까지 겪은 후, 피폐해진 국가 경제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빈약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의 경제 사정이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곤궁한 시기에 사회적 약자들까지 챙기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던 사실이다.
둘째, 물불 가리지 않고 오직 국가 경제재건에만 온 국력을 쏟아 낸 결과로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긴 했는데, 최빈국에서 부국 강령을 구가하는 현재까지 반세기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나 정부의 대국민 가치관이, 군사독재 권력의 존엄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민 존엄성은 하위 개념으로 하방치환 되었다는 점이다.
그마저도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성이야 두말 필요도 없이 겨우 사육의 개념을 벗어난 일방적 수혜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베풀고 사회적 약자들은 시혜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 정부나 이해당사자인 수혜대상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혜택의 파이를 키우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래식 복지 시스템에 전혀 변화가 없이 현재까지 지난 시절의 구조대로 복지정책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4월 총선에 사전 투표장에 가려는 장애인들과 이를 막는 경찰 간 대치 현상을 보면서, 이러한 고리타분한 아날로그식 복지 형태가 조금도 변함없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이 되고 말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정부의 합리적인 대(對)장애인관(觀)에 변화가 일어야 한다.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에 있어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별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믿는 고정관념부터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와 비슷하게, 장애인 단체나 당사자들도, 스스로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의 주체로서, 떳떳하고 자신감 있는 국민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굳게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혹여나, 장애인당사자 스스로, (“우리는 장애인인데....) 라는 투의 주장이나 태도는 이제쯤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당사자 개개인들이,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대응력을 키워나가야 주변인이나 사회로부터도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 시선의 격차가 차츰 좁혀져서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평등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는, 장애인복지 문제를 빵으로만 해결하려 들지 말고,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누구 한사람 소외됨이 없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1부천시, ‘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생활안전관리지도사 방문사업 추진
- 2김종배 위원장,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
- 3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19회 전국장애인문학제 시상식 성료
- 4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아가세, 고령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맞손
- 5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 6유호준 의원,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 참석
- 7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장애인 복지관 급식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
- 8김동희 의원, “장애인 이동이 자유로운 성숙한 경기도 기대”, 특별교통수…
- 9화성시 향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해드림 나들이 지원 사업 실시
- 10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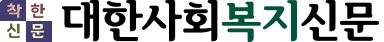
 PDF 지면보기
PDF 지면보기










































